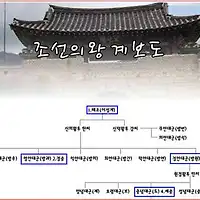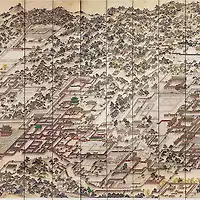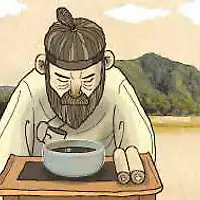조영무, 하륜, 이숙번: 조영무는 본래의 이성계의 수하였다. 하지만 그는 태종의 편으로 전향한다.
하지만 조영무는 재상으로서 원칙적이면서 신중한 성격이었다. 하륜은 굉장히 노회한 인물이다. 유교 뿐만 아니라 온갖 잡학에 능하였고 정치 감각도 대단했다. 태종시대에 가장 출세한 인물로 손꼽힌다. 태종은 부정은 용서해도 불충은 용서치 않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하륜 만큼은 부패와 불충을 눈감아 주었다. 하륜이 이미 나이가 많았으며 태종 정권의 체면과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숙번은 태종의 의형제로 그의 정변에 가담한 인물이다. 이숙번은 문인이면서 무를 겸비한 사람이었다. 왕자의 난 때 보여준 이숙번의 단호함은 결국 큰 공헌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과단한 성격은 태종의 눈 밖에 나게 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조영무, 하륜, 이숙번 등은 큰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그들은 태종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에 처신에 신중했다.
정종 임금: 그는 태종에게 선위한 이후에도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사냥과 연회를 즐기며 여생을 즐긴다. 정종은 23명의 자녀를 낳았다. 태조 역시 태상왕으로서 오랜 연수를 누렸다.
태종의 권력: 태종은 무소불위의 왕권을 가진 임금이었다. 하지만 태종 이방원은 과거 급제 경력이 있는 사대부 출신의 왕이었기 때문에 공론과 무리하게 충돌하려 하지 않았다. 조선은 왕국이었지만, 유교를 국시로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사관, 대간, 경연 등의 제도를 안고 가야 했다. 유교 정치 시스템의 조선은 대한민국 군사정권 시절 보다 언로가 열려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보다 권력이 남용되지 않았다. 또한 유교 시스템은 왕권 강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였다. 어쨌든 왕은 하늘의 대리인이었고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조선의 공론은 왕 뿐만 아니라 신하들을 견제하기에도 유용했다. 태종은 공론을 유도하여 신하들이 자신의 뜻을 대변하도록 하는 편을 선호했다. 국가 시스템을 위하여 태종은 자신의 욕망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면에서 훌륭했다고 평가된다.
양녕 대군: 그는 공부를 싫어 했다. 태종은 그것까지는 눈감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양녕의 문란한 여성 편력은 태종의 분노를 산다. 양녕은 14년간 세자 자리에 있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었다. 태종은 굉장히 오래 참았다고 볼 수 있었다. 양녕은 아버지의 냉혹함을 보면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외숙들의 죽음과 어머니의 극단적인 고통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그의 성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태종의 지적에 양녕은 항의문을 쓰는 도발도 일삼는다. 태종은 어떻게든 장자를 임금으로 앉히려 했다. 하지만 충녕에 대한 신하들의 여망을 참작하여 충녕을 세자로 고려하기 시작한다.
세종 즉위: 태종이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난다. 보통 임금은 상 중에 즉위하지만 세종은 면류관을 갖추고 화려하게 즉위한다. 태종이 충녕을 무한 신뢰했다고 볼 수 있다. 세자가 된지 두 달 밖에 안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태종은 상왕으로서 세종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한다. 세종에게 저해되는 세력은 태종의 군권으로 가차없이 숙청된다.
원경왕후: 세종의 어머니이다. 그녀는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역사의 현장 > 조선 왕조 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선왕조실록-태조와 정도전의 방심/ 이방원의 준동/왕자의 난 (0) | 2014.07.21 |
|---|---|
| 조선왕조실록-태조 이성계와 정도전/ 필연을 가장한 건국 시나리오 (0) | 2014.07.20 |
| 조선왕조실록- 태종, 왕권 강화에 대한 추호의 망설임이 없는 냉혹한 군주. (0) | 2014.07.18 |
| 조선왕조실록-중종, 조광조 없는 국정, 영혼없는 왕 (0) | 2014.07.15 |
| 조선왕조실록- 중종과 조광조의 만남. (0) | 2014.07.14 |